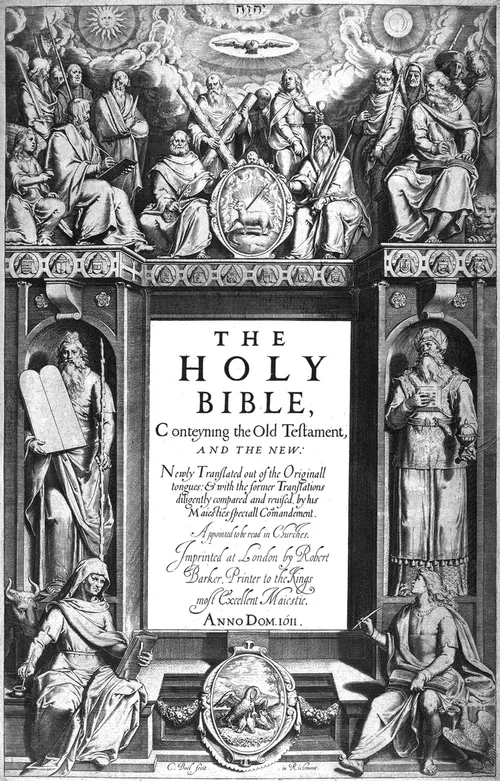강원도 영월 -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임은 기어이 그 강을 건넜네
입력 : 2017.06.08 21:30:00 수정 : 2017.06.08 21:31:18
ㆍ어린 임금 단종 560년 전 청령포로 유배되다
단종은 열두 살에 임금에 올랐다가 열일곱 살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유배됐던 청령포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섬과 다름없는 유형지였다. 사진은 강물이 휘돌아 흐르는 영월 청령포구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시리도록 슬픈 이름 단종. 강원도 영월은 조선시대 비운의 임금 단종의 한과 넋이 서려 있는 곳이다.
12살에 왕이 된 단종은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섬 아닌 섬,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17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다. 청령포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육지이건만 배를 타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다.
■ 단종을 기억하는 영월 사람들
단종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하늘이 뚫렸는지 굵은 빗방울이 퍼붓더니 우박까지 쏟아졌다. 천둥 번개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 비상등을 켰다. 산마을이어서 그런지 천둥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빗방울이 자동차를 거침없이 때렸다.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영월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동강이었다. 스무살 시절 기차역에서 내려 강을 건넜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여름의 기억이 아스라하게 겹쳤다.
영월대교를 건너자 굽은 도로가 나왔다. 옛길로 들어선 것이다. 단종의 영정을 모시는 ‘영모전’부터 찾았다. 야트막한 언덕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건축물은 예스러웠다. 모진 세월을 버텨낸 돌계단을 30여 개 정도 오르는데 커다란 나무들이 호위무사처럼 도열해 있다.
조선 6대 임금 단종은 8살에 왕세손, 10살에 왕세자, 아버지 문종이 승하하던 12살에 왕위에 올랐다. 1452년이다. 이듬해 계유정난으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457년 영월로 유배되었다. 영월에 갇힌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약을 받았다. 17세 때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숙종 때인 1698년에 와서야 왕으로 복위했다.
“영월 사람들에게 영모전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취직·입학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참배합니다. 결혼 후 자식을 기다릴 때도 이곳을 찾아 사배하지요.” 영월군 석병철 학예연구사(38)는 “영월에 영험한 기운이 머물고 단종이 지켜주기 때문에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서 “단종이 없는 영월은 없다”고 말했다.
오래된 향나무가 지키고 있는 영모전은 경건했다. 갑자기 날이 갰다. 햇빛이 차별을 두지 않고 구석구석을 채웠다. 먹구름이 걷히고 나니 영월을 감싸고 있는 짙푸른 태백산 줄기가 보였다. 영월은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 동강을 포근히 안고 있는 배산임수 마을이었다.
“유배지 청령포가 홍수로 범람해 단종이 관풍헌에 잠시 머물렀지요. 바로 이곳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영월군 김종완 계장(54)과 관풍헌으로 들어서자 단종의 목숨을 거두어 간 마당에서 한 맺힌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단종이 소쩍새에 빗대 시를 읊었다는 자규루(子規樓)는 쓸쓸해 보였다. “네 소리 없었다면/ 내 시름 없을 것을/ 네 울음 슬프니/ 내 듣기 괴롭다.” 단종의 절규가 애달팠다.
차를 몰고 아담한 중앙광장을 지나 ‘금강정’으로 올랐다. 잘 꾸며진 산책로를 3분 정도 걸었을까. 단종을 모시던 6명의 궁녀들이 뛰어들었던 동강의 물줄기는 잔잔했다. 한 떨기 동백꽃잎처럼 떨어졌다는 낙화암이 애잔했다.
■ 단종 곁에 머무는 능마을 사람들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떨어졌지요. 영월 호장이던 엄흥도는 목숨을 걸고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노루가 머물다간 자리에 암매장을 해서 노루 장(獐), 장릉(獐陵)이라고 합니다.”
능마을 송대훈 이장(52)은 “1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능마을은 단종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릉을 지키고 있다”며 도깨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400년이 넘는 수령의 느티나무가 있는 신라고찰 보덕사. 영조는 단종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절로 지정했다.
예로부터 단종이 묻혀있는 장릉은 소나무숲이 울창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산에 오르면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신성한 곳을 넘나드냐”며 호통쳤다. 도깨비들은 숙종이 봉분을 세우기 전까지 200여 년 동안 단종의 원통한 죽음을 지켰다. 능마을은 도깨비가 인간에게 장릉을 맡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네는 한적하고 조용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능동천은 새빨간 장미꽃밭이었다. 야생화가 피었고, 나비들이 나풀나풀 춤을 추었다. 단종을 모신다는 보덕사로 향했다. 신라 문무왕 때인 668년 지어진 사찰인데 숙종 때부터 장릉 보덕사로 불린다고 했다. 400살이 넘은 향나무도, 1832년 지어진 해우소도 놀라웠다.
보덕사에서 조금 더 오르면 금모암이 나온다. 경내는 엄숙했다. 운 좋게 주지 스님을 만났다.
“모두가 단종을 기억하고 애석해하지요.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고 모진 슬픔을 훌훌 벗어던지고 떠난 게지요.”
스님은 “인생이 80년이라면 단종은 60년을 남겼는데 그 복을 후손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청령포에 들렀다. 수백년 된 금강송 700그루는 울창했다.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햇빛을 가려 하늘이 한 뼘도 보이지 않았다. 단종이 걸터앉아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30m 높이의 관음송은 모진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육지와 겨우 70m 떨어진 청령포는 배를 타면 채 1~2분이 걸리지 않는 천혜의 유배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팔각정에서 줄배를 타고 건넜지만 많이 달라졌지요. 소나무는 모두 번호표를 달고 있고 산책로는 잘 닦여 있습니다.”
이갑순 문화해설사(59)는 “청령포는 더 이상 눈물의 유배지가 아니다”라면서 “단종을 만나기 위해 한해 250만명이 영월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월은 단종을 슬픈 임금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오래도록 영월을 지켜주고 있는 가슴속에 사는 행복한 임금이었다.
'옛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25를 상기하자 (0) | 2017.10.11 |
|---|---|
| 국내 연구진, 칭기즈칸 가계 비밀 풀었다 (0) | 2016.10.10 |
| 1850년대 조선의 옛사진들 (0) | 2016.05.17 |
| '1950 흥남, 그 해 겨울' (0) | 2015.12.11 |
| [스크랩] 일제 강점기 때의 귀한 사진!? (0) | 201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