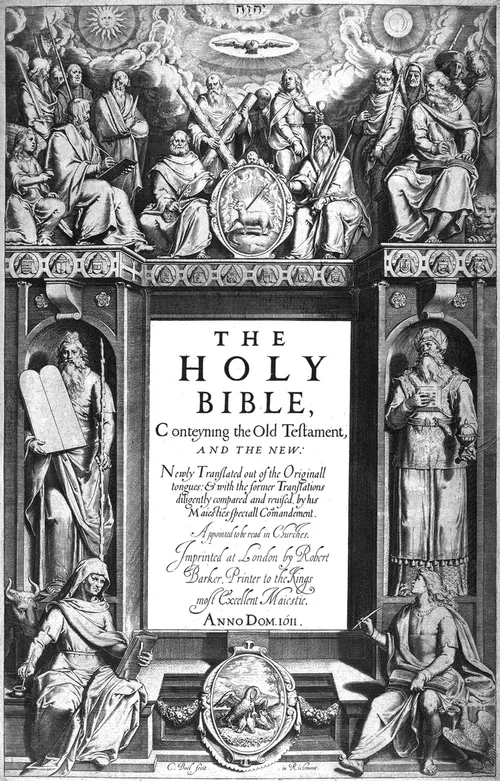뉴욕에서 만난 국내 일류 전자회사 간부로부터 “중국 경쟁업체는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는 호언을 들은 적이 있다. 중국 경계론이 판치는 터라 귀가 솔깃했다. 이유가 특이했다. 기술격차 같은 게 아니었다. “중국에 가봤더니 현지인들이 돈만 벌면 죄다 비싼 한국제·일본제 휴대전화·TV만 찾고 자국산은 외면하더라”는 거였다. 외제를 갖는 게 신분상승의 징표로 통하는 탓이란다. “이래 가지곤 중국제가 고급품으로 올라설 길이 없다”고 이 간부는 장담했다.
뒤집어 보면 국내업체들은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으로 싹을 틔울 수 있었지만 중국 회사들은 그런 기름진 토양이 없다는 얘기다. 지금은 소니·파나소닉을 깔볼 만큼 커버린 국내 전자업체지만 1980, 90년대만 해도 외제에 비해 신통치 않았다. 청소년 간엔 소니 워크맨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미국 주재원이라면 으레 일제 TV, 미제 냉장고를 들여오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 소비자들은 자의건 타의건 무조건 국산품을 써야 하는 걸로 믿었다. 기왕이면 국산품을 사주자는 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 왔다. 최근에 만난 한 교민도 “벼르고 벼르다 한국차를 샀다”며 “이민 3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했다. 법적으로 미국인이 되고도 떠나온 고향의 차를 못 사준 게 마음 한켠에 묵직한 돌덩어리로 남아 있었던 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적잖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성능 좋고 저렴해도 외제는 관세가 엄청나 언감생심이었다. 지난 85년 기사를 보면 462달러 하던 20인치 일제 내셔널 TV는 관세 40%에 세금·마진까지 130만원은 줘야 했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40만원짜리였던 일제 TV를 3배 이상에 사야 했다. 같은 크기의 국산 TV는 5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보호 속에서 커온 국내 대기업들이 어찌 된 일인지 해외에만 나오면 한인들이 안중에 없는 듯하다. 국가브랜드 개선에 도움이 될 텐데도 삼성·LG·현대 어느 곳 하나 한국 기업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오래된 얘기다. 거기까진 그렇다 쳐도 이들 회사 제품을 미국에서 사보면 6개 국어, 8개 국어로 인쇄된 사용설명서에 한글이 없다. 스페인어·프랑스어에 중국 본토인을 위한 간체 한문은 물론 대만인들이 쓰는 번체 한문도 있는데 말이다. 한인 수가 많아지면서 뉴욕 지하철 자동매표기도 한글이 나온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 메트로폴리탄뮤지엄 등 웬만한 박물관에 가도 한글 안내서가 비치돼 있는 게 요즘 미국이다. 도리어 미국에서 산 필립스 등 외국 회사 제품에는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아무리 한국 대기업들의 타깃이 한인 사회 아닌 글로벌 마켓이라지만 한글설명서를 끼워 넣는 작은 배려가 이를 해칠 리 만무하다.
요즘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교민 자녀들을 상대로 한 취업박람회를 열겠다고 하면 한국 기업체들은 어떻게든 빠지려 한다. “원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게 표면상 이유라지만 자신들을 살찌워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잊은 듯하다.
남정호 뉴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