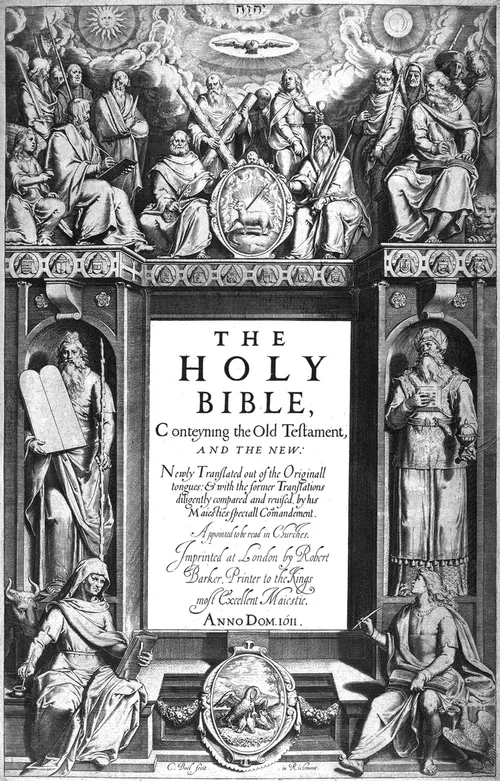관련핫이슈 | |
‘일어서다’와 ‘나가다’의 두 동사가 합쳐서 ‘일어나다’가 되고 ‘들어오다’와 ‘눕다’가 결합하여 ‘드러눕다’라는 말이 됐는데, 그것을 모두 합쳐 하나의 말로 만든 것이 바로 ‘나들이’라는 말이다.
나의 삶도 예외 없이 그랬다. 어머니는 나의 작은 손을 잡으신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몸에서는 레몬 파파야나 박하분 냄새가 났다. 나들이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보리밭 사이 길과 산모롱이 마차 길, 신작로 이렇게 작은 길에서 점점 나들이 길은 넓어진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다 주신 작은 가죽 구두를 신고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것은 가죽구두가 구겨지는 소리가 아니라 눈부신 바깥 공간으로 나가는 내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다. 길가의 뱀풀을 본 것도 땅개비가 뛰는 것도, 하늘에 높이 떠서 원을 그리는 솔개도 모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본 풍경들이다.
역시 나들이의 절정은 십 리쯤 떨어진 외갓집을 찾아갈 때다. 그곳으로 가려면 장승이 서 있는 서낭당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설화산 뒤쪽에 자리한 작은 그 골짜기에는 유난히 대추나무와 감나무가 많았고 그 나무가 우거진 곳에 외가가 있었다.
긴 돌담을 돌아 솟을대문과 십장생이 그려진 어머니의 장롱 속 같은 안채로 들어가면 정말 믿기지 않도록 늙으신 외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미숫가루도 외가에서 타 주는 맛은 달랐다. 사랑채를 지나 일각대문 너머에는 인기척이 없는 남새밭이 있었고 한 구석 빈터에는 양 모양을 새긴 이상한 돌들이 널려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덤에 쓸 석물이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라는 것, 그리고 외할머니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외갓집 사람들에게는 할아버지도 삼촌도 사촌누이와 동생도 모두 다 ‘외’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외갓집은 시간도 달랐다. 벽시계의 모양이 그렇고 시간마다 치는 종소리도 다른 소리를 냈다. 종소리는 깊은 우물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문자판에는 나중에 안 것이지만 십이지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외갓집 시간은 기왓골의 이끼처럼 훨씬 오래된 시간이라 이곳에 오면 어머니도 나처럼 작은 신발을 신은 아이가 되는 것 같았다.
떠날 때가 되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우신다. 외할머니는 긴 돌담을 돌아 서낭당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서 계시고 뒤돌아볼 때마다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하신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이별한다.
늦은 날에는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림책에서 본 것 같은 큰 달이 뜨고 나들이로 나의 장딴지에는 조금 알이 밴다. 키도 한 치가 더 자랐으리라.
나들이에서는 떠나는 것과 돌아오는 것,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다 같다. 번쩍이는 비늘을 세우고 먼바다로 헤엄쳐 나갔다가 다시 모천(母川)으로 회귀하는 연어 떼처럼 외갓집 나들이는 가는 것이 곧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나들이는 달랐다. 그것은 어른들이 기침을 하며 가래침을 뱉는 사랑채의 연장인 아버지의 공간이다. 온주 아문과 향교와 앞으로 혼자서 다니게 될 학교가 있는 구 읍내의 청당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다.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갯길의 의미를 알 것이다. 차를 비킬 줄 모르는 시골 노부부가 지프의 경적 소리에 놀라 오리들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모습,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 놓치지 않으려고 꼭 움켜잡은 손, 천 년을 그렇게 쫓기며 살아온 한국인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한, 바로 그 고갯길이다.
외갓집이 끝없이 과거로 향해 가는 나들이 길의 종착지였다면, 지금은 서낭당 부적 대신 ‘주의 ! 광케이블 매몰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청당이 고개는 한없이 미래로 뻗어 있는 역 철길이었다.
이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