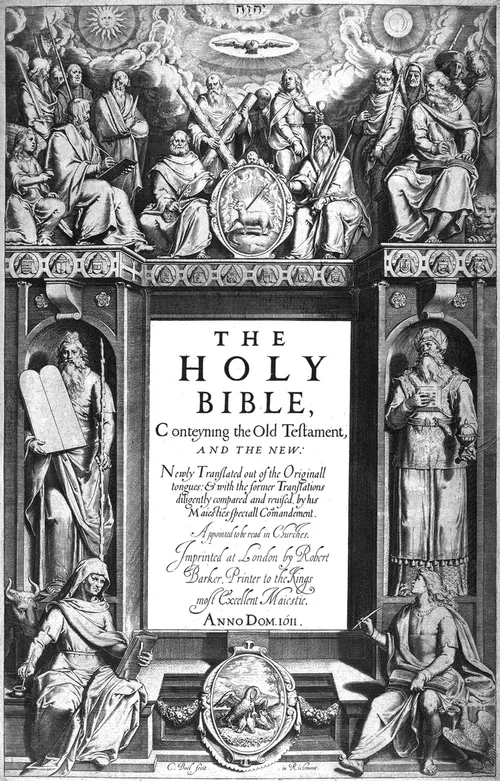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 ▲ 서울역 지하도내에 벽을 마주하고 앉아 무료 급식을 먹는 노숙자들.
“어이 신참, 가서 술 좀 사오지.”
추석 전날인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역 광장. 노숙자들은 역사 주변을 배회하며 구걸, 음주,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술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신참’인 기자에게 몇 백원을 쥐어주며 “소주 1병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인근 노점에서 파는 소주 1병은 1500원이다. 몇번 심부름을 다녀오니 비상금으로 준비한 7000원이 2시간도 안돼 바닥났다.
◆구걸에도 노하우가 있다?
“돈 떨어졌나? 저기 가서 받아오면 된다.”
2~3년 가량 노숙생활을 했다는 윤모(49)씨가 말했다. 서울역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앵벌이(구걸)’를 한다는 말이다. 구걸은 노숙자들에게 쏠쏠한 돈벌이 수단이다. 구걸로 하루에 1만원 가량을 벌어들인다는 윤씨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외국인에게 우선 접근한다”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겁먹고 돈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설령 거절하더라도 면박은 주지 않는다는 것. 그는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우리가 비록 구걸은 하지만 서도 자존심은 센 기라. 무시당했다 생각하모, 기냥 달려든다. 내 참말로 나쁜 놈은 아이다. 하나뿐인 동생 보증 잘못 서서 이 꼴 됐다 아이가.”
땟국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윤씨는 얼핏 보기에 노숙자인지 일용직인지 잘 구분이 안 가게 그런대로 옷을 차려 입은 모습이었다.
구걸 기술을 설명하던 윤씨가 “시범을 보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젊은 여성을 골라서 접근한 결과 2분도 안돼서 ‘건수’를 올렸다 1000원을 버는데 성공한 것.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온 그에게 동석한 동료들과 함께 박수를 쳐줬다.
이번엔 내 차례였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화장실에서 머리 매무새를 고쳤다. 거뭇거뭇한 수염과 감지 못한 옆머리가 기름에 쩔어 있었다.
‘고참’ 윤씨의 조언에 따라 광장을 거닐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에게 성큼성큼 다가섰다. “저, 천원만 좀….” 쭈뼛거리며 말을 건네자 그 여성은 위아래를 훑어보더니만 대꾸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말했다. “저, 천원만 부탁드립니다.” 여성은 ‘휙’하고 눈길을 돌려버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많은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는 서울역 광장이었지만 구걸을 하는 기자가 지나갈 때마다 ‘물길 열리듯’ 사람들이 비켜섰다. 이렇게 20대 여성 10여명에게 구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20대 초반의 남성 귀성객에게 다가갔다. 꾸뻑 인사를 하며 간절한 표정으로 “명절인데 1000원만 부탁드려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추석 잘 보내세요”라며 선뜻 1000원을 건넸다. 정말 고마웠다. 허리를 연거푸 굽히며 “감사합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 ▲ 서울역 지하도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자들. 추석맞이 선물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각지에서 노숙자 500여명이 몰렸다.
서울역 노숙자들 중에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감을 못 구하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해 역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경기침체로 일감이 많이 줄었고 더구나 추석연휴 기간에는 일감 자체가 없었다.
구걸을 하기 전에 낮 12시쯤 광장에 있는 한 노숙자의 거처로 놀러 갔다. 박스 서너 개를 가지런히 펴서 만든 곳이었다. 일행 3명 모두 동료의 ‘집’에 놀러간 손님이 되어 양말을 벗고 박스 위에 앉았다.
“어? 아우님, 양말이 왜 그래?”
강모(36)씨가 기자의 구멍 난 양말을 유심히 보더니 “쯧쯧”하고 혀를 찼다. 그는 배낭을 부스럭 부스럭 뒤지더니 아직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검정색 양말 한 켤레를 내줬다. 미안한 마음에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네 사정이 나보다 더 딱하다”며 재차 권했다. 함께 둘러앉은 노숙자들 역시 구멍난 양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고생을 많이 하다 왔나 봐.” “요새도 저런 양말을 신고 다니네.”
“어서 신어보라”는 그들의 재촉에 양말을 바꿔 신었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일부러 멀쩡한 옷을 찢고 구멍을 냈지만 막상 노숙자 사회의 일원이 되고 보니 부자연스러웠다.
노숙 생활은 생각보다 물자가 부족하지 않았다. 조금만 움직이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었다. 구걸도 주요한 생활수단이다. 요새 노숙자들은 비교적 옷을 잘 입는다.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보내오는 구호용 옷이 많기 때문이다.

- ▲ 노숙자들에게 밥 퍼 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서울역 부근에서는 봉사단체들이 거의 매일 점심과 저녁에 무료급식을 한다. 이날 낮에는 식판에 밥과 국, 제육볶음, 김치, 오이무침 등이 담겨 나왔다. 전날 저녁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역 지하도를 찾아 직접 배식에 동참했었다. 각지에서 500여명의 노숙자가 모여들어 지하도 밖까지 줄을 섰다. 주황색 봉지에 추석선물을 담아줬는데 양말 5켤레, 배와 참외, 음료와 빵이 들어있었다.

- ▲ 봉사단체가 노숙자들에 건네준 추석선물. 봉지를 열어보니 양말 5켤레, 배와 참외, 음료와 빵이 들어있었다.
밤에 잘 때 춥다는 것만 빼면 노숙 생활은 어느 정도 버틸 만 했다. 그래서인지 “이 생활에 맛들이면 여기서 떠나기 힘들다"면서 기자에게 ‘빨리 정신차리라’고 조언하는 ‘고참’ 노숙자들도 있었다. 나름 고마웠다. 노숙자들에는 세상살이에 맞설 수 있는 자립 의지가 더 시급한 것처럼 보였다.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은 모두 젖혀둔 채 그저 되는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무료급식 줄에 서있던 한 노숙자는 “오늘 컵라면 값 굳었으니 소주 한 병 더 마실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