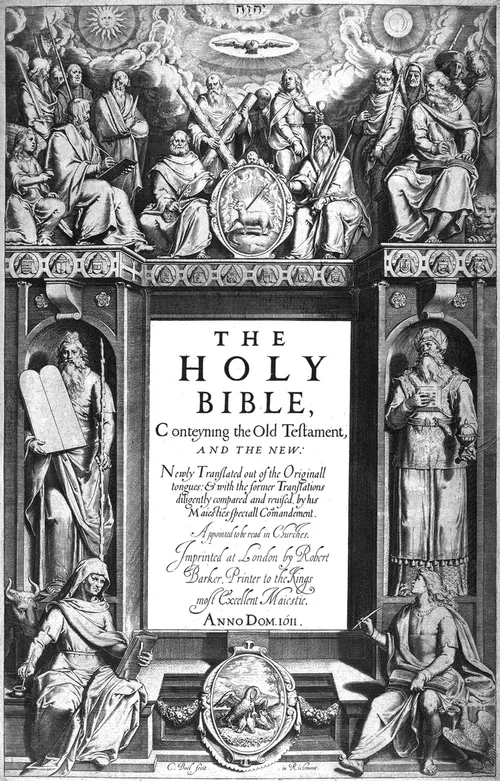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눈에 보이는 신’믿는 이방인에게 ‘보이지 않는 신’설파한 바울
| 터키의 사르디스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유적. 왼쪽에 벽돌로 쌓은 사데 교회(초대 일곱 교회 중 하나)의 풍경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신전과 조촐한 교회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바울의 전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 사이에 ‘예수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 |
젊은 시절, 요한은 욕심이 많았다. 그는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 중 하나는 주의 왼편에, 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다른 열 명의 사도들은 분노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요한에게 이렇게 답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는 이렇게 답했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때만 해도 요한은 몰랐을 터이다. 예수가 받을 잔이 어떤 잔인지 말이다. 그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예수조차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했던 ‘십자가 죽음’이었다. 어둑어둑한 요한의 동굴, 거기서 눈을 감았다. 대체 뭘까. ‘예수가 마셨던 잔’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2000년 전, 사도 요한 역시 이 동굴에 머물며 그걸 묻고, 또 물었을 것이다.
|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밧모섬의 동굴에서 순례객들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다. | |
그랬다.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의 샘으로 통하는 통로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통로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그게 십자가였다. 그건 내 뜻을 향한 온전한 죽음이자, 하나님 뜻을 향한 온전한 수용을 의미했다.
요한의 동굴 근처에 성 요한수도원(1088년 건립)이 있었다. 그리스 정교회의 수사들이 지금도 수도를 하고 있었다. 수도원 박물관에는 양피지에 기록된 큼직한 초기 성경도 전시돼 있었다. 그리스도교의 2000년 역사가 숨 쉬는 밀물로 다가왔다.
오후에 배를 타고 터키 땅 에베소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나자 파도가 거세졌다. 배가 앞뒤좌우로 휘청휘청했다. 그렇게 한동안 달리다 결국 배를 돌려서 밧모섬으로 돌아갔다. 예정에 없던 밧모섬의 1박이었다. 숙소 뒤 산 위로 요한 수도원이 보였다. 밤하늘에 별들이 무척 낮게 깔렸다. 이 밤, 수도원의 수사들도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묵상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요한복음 1장5절)
◆나를 허물 건가, 신을 허물 건가=이튿날 아침 일찍 배를 탔다. 파도는 잔잔했다. 에게해를 건너 터키 땅 쿠사다시에 도착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초대 교회들이 있던 곳으로 이동했다. 에게해에서 멀지 않은 터키 땅에 초대 일곱 교회가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사데 교회로 갔다. 차에서 내려 5분쯤 풀밭을 걷자 어마어마한 신전 유적이 나타났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모셨던 신전(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BC 330년경 건립)이었다.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규모였다. 옛날에 78개의 석주가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었을 터다. 지금은 높이 18m의 거대한 석주 2개가 남아 있었다.
신전 귀퉁이에 있는 사데 교회의 유적은 초라해 보였다. 웅장한 신전과 조촐한 교회의 모습이 무척 대조적이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풍경은 꽤 흔했을 터이다.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전도 여정은 사실 그리스 신들과 로마 신들의 틈새에 ‘예수의 씨앗’을 심는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설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번은 그리스의 신을 믿는 이가 바울에게 물었다. “이 많은 신들의 석상 중 당신이 믿는 신은 어느 신이오?” 주위를 둘러보던 바울은 석상을 하나 발견했다. 그 아래 ‘이름 없는 신’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바울은 그 석상을 가리키며 “내가 말하는 신은 바로 저 ‘이름 없는 신’이오”라고 답했다.
초대 교회 유적지에는 들꽃이 곳곳에서 한들거렸다. 그 꽃들은 이름을 갖기 전부터 존재했다. 그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랬다. 신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신이 있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신에게 이름을 붙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이름 없는 신’을 향해 이름을 붙인다. 나의 바람, 나의 욕망, 나의 가짐을 ‘기도’란 이름으로 포장한 채 신에게 들이댄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이다.
2000년 전 바울이 낯선 땅의 회당과 신전에서 싸웠던 대상도 이것이었다. 우상(偶像)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돌이나 쇠로 빚은 것을 우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는 달랐다. 나의 가짐, 나의 욕망을 위해 부르는 모든 신이야말로 우상 중의 우상이다.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나를 위해 빚은 신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신을 빚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산다.”(갈라디아서 2장20절)
바울은 하나님의 현존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허물었다. 그건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이기도 하다. 결국 누구를 허물 건가의 문제다. 나를 허물 건가, 아니면 신을 허물 건가.
◆에베소에서 만난 빛과 어둠=버스는 에베소로 향했다. 로마 시대, 에베소는 아시아 주(州)의 수도였다. 바울 당시에도 25만 명이 살았던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다. 버스에서 내렸다. 에베소 유적지 입구에 ‘누가의 무덤’이 있었다. 팻말에는 한글로 ‘1860년 영국 고고학자가 본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와 황소모양이 그려진 비석을 보고 누가의 무덤이었음을 판정하였다. 예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누가복음 19장10절)라고 적혀 있었다. 밧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요한의 묘지도 에베소의 성 요한 교회에 남아 있었다.
에베소에는 무너진 돌과 기둥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옛 신전과 원형극장, 로마식 공중 목욕탕도 있었다. 2000년 전, 돌로 만든 도로가 시내에서 항구까지 이어져 있었다. 2세기에 건립된 셀수스 도서관은 위용이 대단했다. 바울의 첫 전도여행 목적지도 실은 에베소였다. 그러나 바울은 길이 막혀 터키 서부와 그리스 땅을 거친 뒤에야 뱃길을 통해 에베소로 갔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에베소서 5장8절) 그랬다. 그건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요한의 메시지와도 맥이 통했다. 어둠의 두께, 어둠의 깊이는 ‘나의 뜻’에 대한 집착의 세기와 비례한다. 그걸 알 때 우리는 깨닫는다. ‘나의 뜻’이 무너지는 순간, ‘아버지의 뜻’이 흐름을 말이다. 그게 바로 빛이다. 그러니 아무리 짙은 어둠도,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 순간 바울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이다.
에베소를 떠나 다소로 향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이었다. 유년기의 바울과 청년기의 바울은 과연 어땠을까. 또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었던 바울은 어떤 사연으로 사도가 됐을까. 다소에서 ‘2000년 전의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밧모섬·에베소(그리스·터키)=글·사진 백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