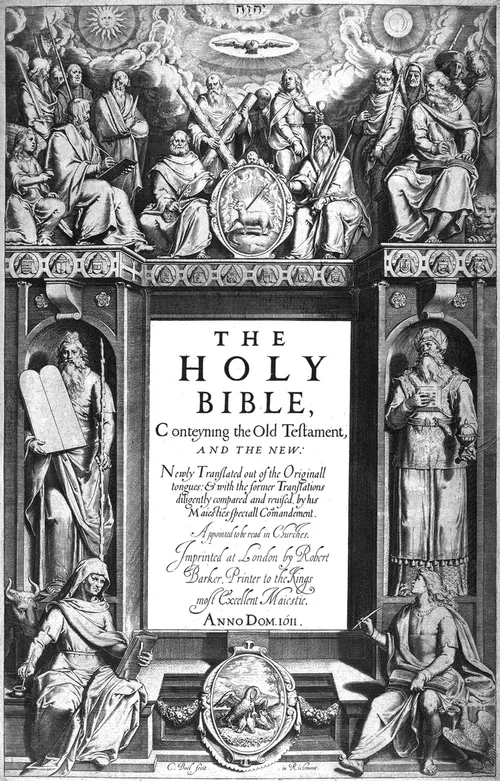입력 : 2012.03.22 23:42
1908년 3월 23일과 이듬해 10월 26일, 두 날 모두 오전 9시 30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역과 중국 하얼빈역 플랫폼에서 총성이 울렸다. 사진 속 대한제국 외교 고문 스티븐스(왼쪽)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죗값을 치렀다. 일본 정부의 추천에 따라 1904년 한국에 온 스티븐스는 이듬해 부임한 이토 통감을 도와 대한제국의 멸망을 기획했다. 스티븐스는 "이토 통감의 존재는 한국의 큰 행복"이라고 했고, 이토는 "스티븐스의 죽음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가까운 사이였다. "국가의 공적이나 도적을 대하는 데 공법(公法)을 들먹일 여지가 없다."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탈해 통감 정치를 한 죄다." 장인환과 안중근 두 의사(義士)가 남긴 거사의 변은 정당하다. 그들의 의거가 한국 병탄을 앞당겼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토와 스티븐스 - 대한제국 멸망의 두 ‘기획자’였던 이토 히로부미 조선통감(오른쪽)과 스티븐스 대한제국 외교고문이 1907년 서울 덕수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토와 스티븐스 - 대한제국 멸망의 두 ‘기획자’였던 이토 히로부미 조선통감(오른쪽)과 스티븐스 대한제국 외교고문이 1907년 서울 덕수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선열들의 핏빛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국망(國亡)을 피하지 못했다.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우리는 국제 정세에 무지했고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힘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실패의 역사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몫부터 찾는 것이 순리이다.